오작인 전기수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찾아서 알아봅니다.
작성자 정보
- 삼둡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721 조회
- 목록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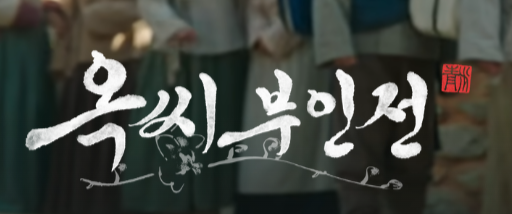
옥씨부인전에 나오는
인물의 직업을 가리키는 말인데
궁금해서 찾아서 알아봅니다.
조선의 전문직?! 조선과학수사대 CSI ‘오작인’ CSI도 울고 갈 조선의 과학 수사대 이야기

仵作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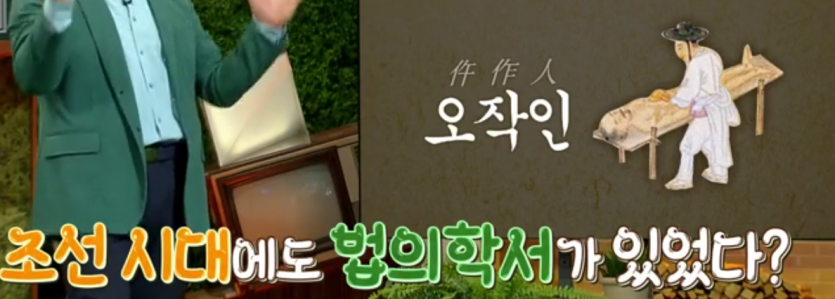
조선시대에도 법의학서(무원록) 법의학자 들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오작인
(죽은 자는 원한이 없다는 뜻의 법의학책)
https://webzine.nfm.go.kr/2016/03/29/조선-시대에도-과학수사대가-있었다/
오작인은 시신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누군가 사망하면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쓴다. 사망 원인이 분명치 않으면 검시를 해야 한다.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의문스러운 죽음에 검시가 필요했다. 자살과 타살 여부를 가려야 하고, 사망 원인도 찾아내야 한다.
조선 시대의 검시는 2번을 기본으로 하였다. 서울은 형조가, 지방은 수령이 이를 맡았다. 형조의 관리는 법률을 맡은 율관, 의사인 의관, 그리고 한성부의 서리와 오작인을 데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때 오작인은 시신을 뒤집거나 만지는 일을 하였다. 사실 관리들은 시체를 보는 일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리와 오작인의 말을 믿고 그대로 검시보고서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때 오작인의 요령 없는 보고 때문에, 검시보고서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 실수로 가난한 사람을 죽였을 때, 오작인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례식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고, 검시할 때는 적당한 뇌물과 대접을 요구하기도 하여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날릴 수도 있으니 억울하지만 부자집의 돈을 받고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를 개인간의 화해라는 뜻으로 ‘사화私和’라고 불렀다. 물론 오작인의 경우에는 돈을 받고 타살을 자살로 꾸며 보고하였다.
https://www.kidshankook.kr/news/articleView.html?idxno=1683
조선 후기에는 길거리에서 돈을 받고 이야기책을 읽어 주던 사람들이 있었어. 이들을 ‘전기수’라고 해. <심청전>ㆍ<숙향전> 등의 전기소설(傳奇小說)를 읽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전기수는 시장ㆍ다리 밑ㆍ길거리ㆍ담뱃가게 앞 등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청중들에게 소설을 낭독했어. 물론 줄줄 외워서 혼자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내며 억양과 감정을 섞어 이야기를 해 주었지. 영조와 정조 때 문학가인 조수삼의 <추재집>에는 전기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
동대문 밖에 <숙향전>ㆍ<심청전> 등의 전기소설을 구성지게 잘 들려주는 전기수가 살았어. 솜씨가 좋아 청중들은 빙 둘러싼 채 전기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 그런데 전기수는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흥미진진한 대목에 이르면 갑자기 침묵을 지켰어. 그러면 청중들은 다음 대목이 궁금해 너도 나도 돈을 던졌어. 그제야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지.
출처 : 소년한국일보(https://www.kidshankook.kr)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81012/92362882/1
땅꾼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직업 중 하나가 ‘전기수(傳奇叟)’다.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읽어주는 노인이란 뜻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심청전, 홍길동전, 춘향전 같은 소설을 돈을 받고 낭독해 준 전문 직업인이다.
조수삼(趙秀三)의 ‘추재집(秋齋集)’에 따르면, 전기수는 종로에서 동대문 사이를 6일 간격으로 오르내리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소설을 낭독하였다. 흥미로운 대목에 이르면 소리를 그치고 청중이 돈을 던져주기를 기다렸다가 낭독을 계속했다고 한다. 낭독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임경업전을 읽던 전기수를 간신 김자점으로 착각한 한 청중이 뛰어들어 낫으로 낭독 중인 전기수를 찔렀을 정도라고 한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